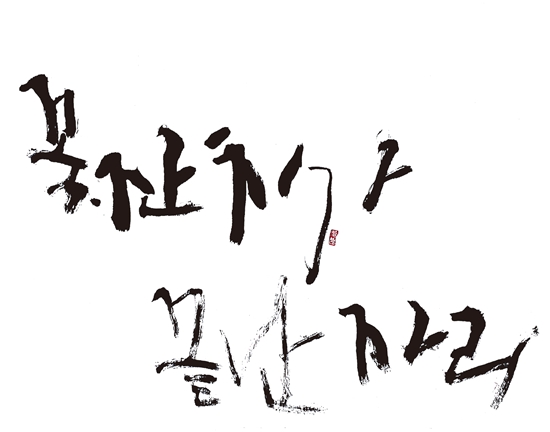
비밀번호를 꾹꾹 힘주어 눌렀다. 삐삐삐삐삐... 컴컴한 복도를 꺾어 뚜벅뚜벅 걸음이 무겁다. 다시 열쇠를 돌려 들어서니 미처 끄지 못한 노트북 불빛과 밤새 쓰다만 묵향이 가라앉아 있다. 아니다 밤새라는 말은. 불과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작업한답시고 분주하다가 눈을 좀 붙여야겠다 싶어 집엘 잠시 다녀왔을 뿐이다. 새벽까지 붓 작업을 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작업들을 이젠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조금은 한숨을 돌려도 되겠지 싶어졌다.
일부러 구부러진 국도를 달렸다. 이맘때는 두 눈 질끈 감아 버려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또 나와 버렸을까. 금방 후회를 해 버린다. 찬란했던 벚꽃이 모두 떨어지고 새로 난 잎이 너무도 연초록하다. 가로수 잎도 연하고 길가에 풀도 연하다. 지나치는 마을 어귀의 큰 정자나무도 가장 순한 계절이다. 먼 산의 나무들이 온통 몽글몽글한 처녀의 젖가슴 같이 피어오른다. 시기를 견주듯 앞 다투어 잎사귀 물이 오르다보니 너나 나나 어쩌면 가장 솔직한 계절이기도 하다.
연초록이 주는 행복에 입으로 탄성을 지르면서도 가슴은 울컥 슬픔에 차 버린다. 머지않아... 꽃이 그렇게 떨어져 버렸듯이... 또 눈 깜짝할 사이... 짙은 녹음으로 변해 버리고 말거야. 그리고는 뙤약볕의 무더운 여름이 오겠지. 변덕스러운 내 심장만큼이나 슬픔이 가슴을 뒤흔들어 버렸다. 이토록 찬란할 때 나는 왜 슬퍼질까...
구례 쪽에서 섬진강을 오른쪽으로 끼고 달렸다. 강 건너 하동이 나란히 따라 달린다. 길가의 매화나무 잎들이 예쁜 여자마냥 새침하다. 이른 봄부터 꽃 잔치로 떠들썩했던 길이 너무도 차분해져 버렸다. 큰 도로가 새로 뚫려 옛길을 지나는 차가 별로 없어 한적하기만 하다. 마을의 사람들이 잔치가 끝나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 같다 생각했다. 그래서 그 길이 더욱 슬펐다. 너무도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너무도 슬퍼하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달려야 할까...
다시 내 마음을 가두어 놓으려 애를 썼다. 커피를 샷 추가해 진하게 두 잔을 주문했다. 오늘만큼은 두 잔을 앞에 두고 욕심껏 마셔야만 한다. 봄과는 어울리지 않게 어두운 옷을 꺼내 입고 아직 겨울이야... 중얼거렸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작업실로 들어선다. 터벅터벅. 터벅터벅.
사월병(四月病)은 꽃가루알레르기와 함께 늘 이맘때 찾아왔다. 에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