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 혼란스럽다’…대사관 직원까지 연락해 걱정
따뜻하게 맞아 준 간호사들과 같은 병실 환자 덕에 ‘안심’
“시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좌충우돌 ‘안데스’ 산행기] ⑦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뉴스사천=박용식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자신의 가치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끝까지 안 해보면 모른다. 나는 끝점을 확인했다. 의지와 체력이 고산을 오르기에는 적절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뒤에야 당시 심근경색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끔 등산 중 누군가의 심정지로 헬기가 떴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딱 그 경우다.
헬기 착륙 지점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산소 호스를 코에 꽂은 채 곧장 1시간 거리의 근처 병원으로 갔다. 도착하자마자 등반 대행사인 인카의 직원이 탄 차도 도착한다. 구급차를 따라온 모양이다.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입원실로 갔을 때 그 직원은 작은 비닐봉지를 두고 갔다. 칫솔과 비누, 샴푸, 스프레이 파스, 과자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내일이면 병원에서 나갈 건데, 왜 이런 걸 사왔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 입원한 병원은 작은 시골 마을의 큰 보건소 같은 곳이었다. 혼자만 있는 입원실의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파리도 모기도 없고 에어콘도 없었다. 해발 1,700m 정도의 고산 마을이어서 그런지 여름이었지만 시원했다. 숨찬 거 외엔 딱히 증상도 없었기에 하루나 이틀 지나면 병원에서 나가는 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대행사인 인카에서 전화가 왔다. 멘도사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어떤 병원으로 갈 것인지 묻는다. 나는 ‘무슨 소리냐? 고산증은 그냥 하산해서 하루 이틀 쉬면 되는 건데 큰 병원으로 간다니 무슨 말이냐’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공공병원으로 갈지 민간병원으로 갈지 선택하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짧은 영어 실력으로 소통이 잘 되진 않았지만 ‘퍼블릭 하스피털(public hospital)’은 정확하게 들렸다. 나는 공공병원으로 간다고 했고, 점심 무렵에 젊은 의사 한 명과 멘도사 병원의 구급차가 나를 태우러 왔다.
다시 한 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한 곳은 제법 큰 병원이었다. 나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는지 알 수도 없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과잉진료 아닌가? 실력은 있는 건가? 뭘 하려는 건가? 온갖 의문이 들었지만 딱히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 수가 없다. 아무래도 번역기로는 한계가 있다. 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
입원실 침대에 누운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옆의 아저씨가 말을 걸어온다. 아니 그냥 마임이다. 오후에는 차와 간식을 주는데 그것을 먹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뭘 알려주는지는 알 거 같다. 작은 티백 같은 봉지를 뜯어서, 가루를 물에 타고, 같이 주는 과자에 잼을 발라 먹으라는 말인 거 같다. ‘엄지척’은 내가 하는 게 맞단 말인가? 아니면 맛있단 말인가? 나도 따라서 웃으면서 ‘엄지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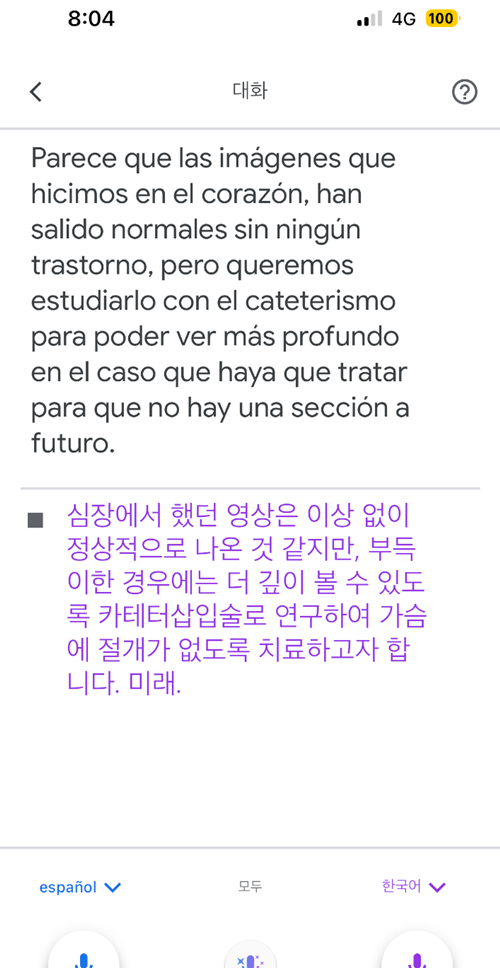
맞은 편 할아버지는 영어가 좀 된다. 나보다 잘하는 거 같다. 이것저것 설명해 준다. 간호사와 번역기로 소통할 때도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설명해 준다. 아, 바로 옆의 아저씨가 번역기 쓰는 법을 아셨다. 스페인어로 전화기에 대고 말하면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나에게 보여 준다. 서로 소통이 되는 걸 신기해하면서 병원 생활 안내를 하나하나 해 준다. 소변을 본다고 하면 화장실에 못 가며, 대변을 본다고 해야 몸에 붙어 있는 여러 개의 선을 떼고 화장실에 갈 수 있음을 몸짓으로 보여 준다.
간호사들은 수시로 와서 혈압과 체온을 재고,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한 집게를 손가락에 물린다. 혈액 검사는 물론 종이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심전도 검사도 여러 번 해 간다. 간호사들과도 번역기로 소통한다. 내 전화기에 스페인어로 문자 보내듯 입력한다. 말하는 것보다 그게 편한 모양이다. 나는 그것을 한국어로 변환해서 알아듣고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스페인어로 번역된다. 검사의 종류나 먹는 약의 이름 정도는 알 수 있다.
큰 병원으로 옮긴 다음 날 전화를 받으라고 한다. 놀랍게도 한국어가 들린다. 대사관의 변호사라고 한다. 병원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을 했다고 한다. 뭐지? 병원에서는 내가 심근경색에 걸렸다고 보고 있고 곧 관상동맥조영술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스탠트 시술을 할 거라고 한다. 대사관에서는 바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권했는데 병원에서는 급한 거라서 아르헨티나에서 시술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비는 안 낸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한테도 병원비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아, 이게 뭐지? 대사관에까지 연락할 정도로 위중한 것이었나? 바로 경상대학병원의 이동훈 교수께 연락하고, 이동훈 교수는 또 병원의 주치의와 통화한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나는 심장병 환자가 된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다. 관상동맥은 또 뭔가? 병원비는 왜 또 안 받는 것인가? 갑자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다. 또한 친절했던 간호사들과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려 했던 젊은 의사들을 의심스럽게 대했던 내가 초라해진다. 병원비가 무료라는, 현실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이다.
시술 날짜가 잡히고 초조할 때, 옆에서 말 걸어 주던 간호사들이 큰 위안이었다. 병문안 오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지 않는 병든 이방인은 이제는 교수도 아니고 등반가도 아니다. 그들은 나에게 따듯한 간호를 해 준다. 번역기에는 반말로 번역되지만, 그게 더 정답다. “너는 뭐해?” 직업을 묻는 거 같다. “나는 대학교 선생이야!” ‘오호~’의 반응은 만국 공통어인가? “한국 사진 보여 줘. 가족은 있어? 한국까지는 비행깃값이 얼마나 돼?” 시술을 앞두고 초조해할 때는 이런 문자도 보여 준다. “시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