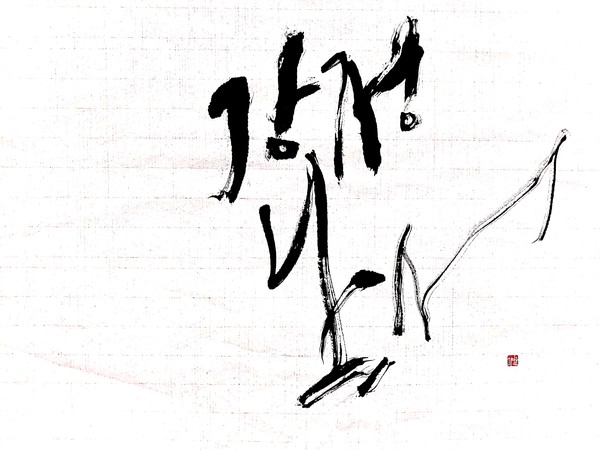
뒤적뒤적, 그러다가 잠시 멈추기도 한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북향 서재 얇은 어둠 속에는 쿰쿰한 책 냄새로 가득하다. 금박 글씨가 박힌 두꺼운 자전(字典)들과 온통 이국의 문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해야만 한다. 10여 년을 함께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20여 년을 이 서재에서 버티고 있었다. 집에서 붙여오는 용돈이 충분하지 못해 새벽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로, 나는 대학시절 꽤 여유롭게 두꺼운 전공 책을 수집하는 취미가 생겼고 한동안 그 즐거움에 돈을 벌었던 기억이다. 그래서 책은 적금통장과도 같은 귀한 물건이 되어 있었다. 옮기는 공간마다 장승처럼 버텨 힘이 되었다. 노끈을 준비하고 또 다른 보금자리로 옮기려고 책장에서 한 권씩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색색이 빛바랜 포스트잇이 페이지마다 붙여진 한시집(漢詩集)을 꺼내 들었다. 포스트잇을 빼내려고 페이지를 넘기니 내가 한동안 참 애정 했던 한시가 펼쳐진다. ‘화간일호주(花間一壺酒) 독자무상친(獨酌無相親)...’ 그래, 난 그때도 두보(杜甫)보다 이백(李白)을 더 사랑했었지.
또 다른 책을 넘기니 누렇게 변색한 열차표가 나온다. 나는 순간 누구와 함께 이 낯선 조치원을 다녀왔을까... 그랬다. 휴학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린 선배를 찾으려고 한밤중 또 다른 선배와 급히 대구에서 밤 열차를 탔었다. 함께 열차를 탔던 그 선배는 졸업하고 몇 년 후 병이 깊어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들어야만 했다.
중국어가 빼곡한 원문에는 산동성(山東省) 어느 대학 마크가 찍힌 중국친구의 쪽지가 있다. 중국어로 오고 가던 쪽지를 보니 고향인 절강성(浙江省) 항주로 돌아가 학교 선생을 하고 있을 것이리라. 사귐이 있던 그 해 춘절(春節)에 제남에서 항주로 내려가는 열차표만 매진되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대학을 졸업하고 소식이 끊겨버린 그 친구의 고향집을 찾아 왕래가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다.
간혹 누군가가 읽지 않는 책을 달라고 하면 단번에 거절을 한다. 나는 책을 읽어내려 가면서 글귀에 멈추어 줄을 긋고 그때 느끼는 감정을 낙서처럼 적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책은 공유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기장과도 같은 공간이 되었다. 책 속에는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속에 기생하고 살던 내가 있었다. 낙서가 있었고 값을 지불한 영수증이 있었고 쪽지가 있었고 몰래 끼워놓았던 지폐가 있었다. 책 속으로 깊숙이 숨어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일상을 끼워 넣으며 시계를 돌리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