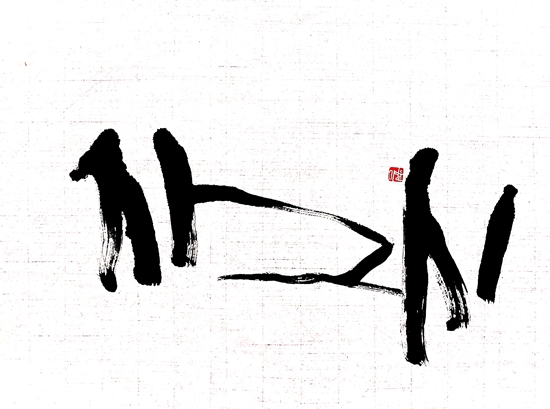
가을이 가장 ‘가을’다울 때 가을 속을 달렸다. 지리산 자락 하동으로 접어드니 지난 봄 어지러웠던 꽃 잔치 대신 찬란한 단풍이 가슴으로 들어온다. 마을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은 단풍보다 더 화려했고 간혹 까치밥처럼 남은 매달림은 낙엽보다 더 쓸쓸하다. 잠시, 얼마 전에 다녀 간 이곳을 기억했다. 그 때는 이만큼 화려하진 않아도 이만큼 쓸쓸하지도 않았다.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산중턱 차방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추사의 세한도가 생각난다. 소나무가 산세와 함께 하늘에 닿아 있었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산마을에서 한 점 뚝 떨어져 나간 양지바른 쓸쓸한 집이라 여겼다. 세상인심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린 추사의 추운 심경을 비웃듯이 찻물이 끓고 이야기가 흐른다. 잠시 시선을 창으로 두었더니 일찍 넘어가는 해가 서러운 섬진강이 흐른다.
산 중턱 차방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참 오랜만의 내려다보기였다. 화난 사람마냥 눈을 치켜뜨지 않아서 좋았다. 고개를 애써 들지 않아서 더 좋았다. 평화롭게 눈을 지그시 내려 깔아도 세상 풍경이 눈으로 들어 왔다. 눈에 힘이 풀리니 쥐었던 손으로 힘이 빠져 나갔다.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이야기 거리 잔뜩 담아 싣고 왔던 것이 그것도 무의미해져 버리고 그저 이 공기와 이 풍경을 가슴에 담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 느꼈다.
도시에서 지내다 주말에 이곳에 들어오면 무엇을 하며 지내시냐고 물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가끔 내려가서 걷는다는 사내의 말에 이곳이 숨구멍이라 여겼다. 사내들은 굳이 한 시간 정도를 달려 회귀하듯 다시 고향동네에 와서 왜 숨구멍을 만드는지를 물었다. 사내들은 가장 편안한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 회귀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었다.
찻물 끓는 소리에 말없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니, 뜰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근경을 만들고 저 멀리 섬진강과 산자락이 원경을 만들어준다. 중거리 풍경이 사라져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어쩌면 사람이 사는 일도 가장 잘 볼 수 있는 저만치쯤이 보이지 않아 사람을 잃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 않을까 여겼다. 먼 일은 추억이라 말하고 지금은 일기라 하였다. 얼마 전쯤은 기억이라 하고 싶은데 간혹 그 기억이 흐릿해져 버릴 때 소스라치게 놀라 편집의 필름을 돌려댄다. 간혹 기억에 오류가 생겨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어야 했다 되묻지만 사람의 일이란 게 그리 눈 근육마냥 손바닥마냥 쉽게 내려지지를 않는 일이었던 것이다. 내려다보기를 하면서 내려놓기를 알아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