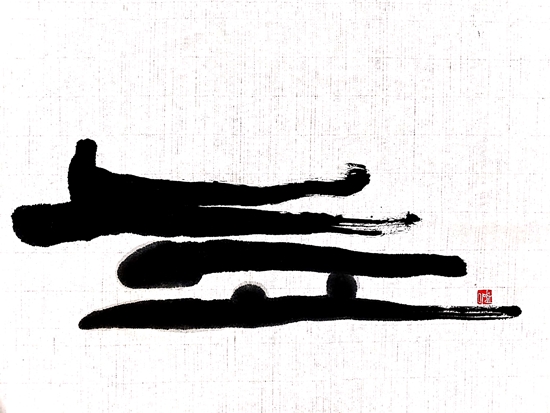
넉 달간의 밤샘 작업을 마쳐서야 이제 겨우 허리를 조금 펼 수 있게 되었다. 수 십장의 사진이 영상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사진 속에는 지난 뜨거운 여름, 뙤약볕을 피하려 작업실로 들어왔다 꼼짝없이 잡혀 일손을 거들고 있는 양복 입은 신사도 보였고,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려 커피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온 젊은 낭만가도 결국에는 함께 노동요를 불러 주어야만 했다. 뚜껑 닫은 스포츠카를 타고 태풍 속을 뚫고 온 두 중년의 멋쟁이는 비 내리는 부산 해운대의 첫사랑을 얘기하며 열심히 돌을 갈아댄다. 새벽 어시장 다녀오던 요리하는 남자도 새벽 불빛에 문을 두드렸다.
힘들다고 어리광을 부려댔더니 오며 가며 얼굴을 내밀어 준다. 이때 나는 먹이를 사냥하듯이 주저앉히고야 만다. 돌 가는 일과 도장 찍는 일, 기술을 요구하면서도 어쩌면 단순 노동일 수 있는 작업의 참맛을 알려 주고 싶었다고 둘러댔다. 그러한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니 감사하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도 입꼬리를 올리며 수긍을 해 준다. 사진 속에는 지나가던 행인 1, 2, 3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진 속 그 공간을 늪이라고 불렀다. 왔다가는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아니 나가고 싶지 않은지 그들은 그 발에 힘을 줘 버린다. 그래서 늪이었다.
모아 놓았던 것들을 펼쳐 놓아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까지 내 속에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던 것이 이젠 다른 사람들의 심장소리를 내가 두드려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친구들 때문에 시계 알람처럼 알게 되었고, 그들은 나에게 수시로 전화해서는 나의 디데이를 알려 주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심장을 저들이 관리하기 시작했다. 심장이 쫄깃해지게 촉박함을 알려주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대어 심장 마시지도 저들이 다 알아서 해 버린다. 불도저 같다고 입도 쩍 하니 벌려 주기도 하고, 많은 작업량에 기가 막히다 눈을 흘긴다. 하지만 감동스러울 거라고 눈시울도 붉혀준다. 그래서 나는 오감이라고 더 큰 소리를 쳐대곤 했다. 모두들 다 같은 늪에 빠진 거라고... 나의 늪을 자랑했다.
늪은 항상 가동 중이었다. 오징어잡이 배처럼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 놓는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가 2층에서는 매일같이 드드득 드드득 돌 새기는 소리가 났다. 늪에 빠진 여자는 봄을 이곳에서 보냈고 여름을 이곳에서 나고 가을을 이곳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늪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