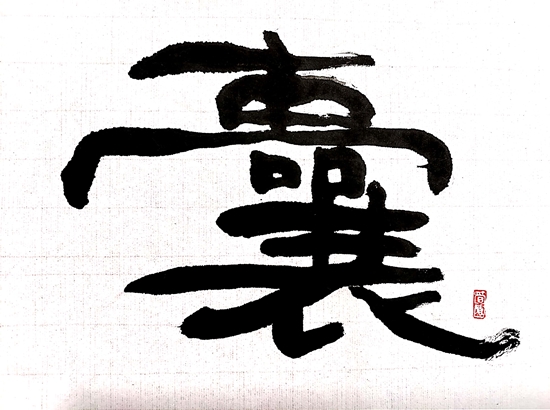
와르르~ 안에 들어 있던 것들을 왕창 쏟아부었더니 바닥 한가득 전쟁이라도 난 듯이 어지럽다. 작은 가방 안에 무슨 욕심을 이렇게 채우고 다녔는지, 무엇이 이리도 중요한 것들인지 참 어려운 일이다. 꼭꼭 숨겨진 가방 속사정이 바깥세상으로 소환되었다.
얼마 전부터 나는 몇 개의 메모장과 포스트잇을 꼭 넣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다. 갑자기 마음이 동하면 급히 어딜 가다가도 차를 세워 생각들을 몇 자 끄적거린다. 그 순간이 지나면 바람처럼 다가왔던 미세한 세포 같은 감정들이 사라져 버렸다. 아직 핸드폰 메모에 익숙하지 않은, 아니 그보다도 생각이 떠오를 때 조금은 아날로그적인 글씨로 쓰고 싶었다. 그래서 내 가방 속 최고의 사치품도 대학 첫 출강 때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몽블랑 펜이기도 하다.
나는 자주 두통에 시달렸다.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 오면 게보린 한 알을 삼키고 30분가량 자다 일어나야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통증이 사라졌다. 대신 꼭 게보린이어야만 했다. 그래서 내 가방 속에는 항상 게보린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가방 속 게보린은 유통기한이 아주 많이 지나버렸다. 작년, 단식으로 하혈을 한 이후 두통과 여러 가지 통증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대신 가끔 빈혈이 찾아오니 이때만큼은 내가 가장 온순해지는 시간이다. 요즘은 일본을 다녀온 지인들이 사다 준 일본제 두통약, 소화제, 파스들로 내 가방 속은 온통 메이드 인 제펜이 되어 버렸다.
명함들이 제법 나왔다. 도무지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이름도 있다. 거창하게 자기 설명이 많은 명함은 읽어 보고 싶질 않았다. 휴지통으로 넣어 버린다. 어느 순간부터 불필요한 것들은 줄여야겠기에 내 기억 속에 두려 하지 않았다. 그 명함 속에는 지금까지도 돈독한 인연의 사람이 있고, 짧은 인연으로 끝나 버린 사람도 있었다.
눈가 주름은 가끔씩 거울에 비춰 보지만, 손은 한순간도 내 눈을 벗어나질 않았다. 튜브형 핸드크림이 끝까지 짜낸 흉터로 말라 있다. 손을 귀히 여겼지만 연이은 전각 작업으로 돌가루가 손에서 털어지질 않아서인지 어느 날 나는 거칠어진 손을 마주하게 되었다. 당혹스러워 가장 먼저 한 일이 가방 안에 핸드크림을 넣는 일이었다. 운전을 하다가도, 핸드폰을 만지다가도, 손등이 보이면 습관적으로 핸드크림을 듬뿍 발라 문질러 댄다.
오늘 새 가방이 생겼다. 약간의 여윳돈이 생기면 가죽 가방 만드시는 선생님을 찾아가게 된다. 나에게 부릴 수 있는 사치를 가난한 예술가와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기도 하다. 새 가방에 담고 싶은 것들을 다시 하나씩 정리하며 넣고 있으니 버려야 하는 기억만큼이나 더 진한 가죽 냄새가 진동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