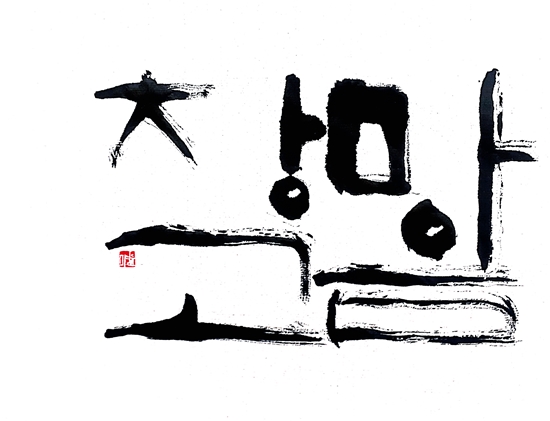
간혹 새 옷을 입고 싶어질 때가 있다. 단 한 번의 세탁도 한 적이 없는 각이 맞춰진 옷을 입고 싶어졌다. 단골가게로 들어가 기분 좋게 옷 몇 벌을 골라 가게를 나왔다.
휴일 아침, 몇 일전 산 옷이 라벨도 떼지 않은 채 종이가방에 그대로 담겨있다는 게 생각이 났다. 그럼 그렇지! 내가 욕심 부린 그 쇼핑조차도 내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것을. 내팽개쳐 놓은 미안함에 제대로나 걸어 두어야지 싶어 드레스 룸을 열었다. 옷걸이가 휘어질 정도로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다. 평상시 옷에 관심 있는 편이 아니지만 언젠가 입을 거라 버리지 못했던 옷들이 한 틈의 빈 공간도 용납하지 않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입지 않은 옷들과 손에 닿지 않은 옷들이 유행을 지나 세월처럼 걸려 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었을까 의아했다. 가지고 있는 신경쓰임을 가장 싫어하면서 문 닫힌 그 공간에서는 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마치 언젠가는 필요한 것이 될 듯이 명(命)을 길게도 지켜내고 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들어오기만을 반겼지 내보내질 못하고 있었다. 마음에 바람이 들어 산 흰 원피스가 몇 번 입어 보지도 못한 채 몇 년째 그대로이고, 늘 그렇듯이 내 옷 방은 분류만 다른 검정만이 가득했다.
드레스 룸 가득 걸려있던 옷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빼냈더니 거실이 금방 옷 무덤이 되어 버린다. 옷 주인장이 참 욕심스럽고 심술 맞아 보였다. 뭐든 넘친다고 여기면 숨부터 막혀오는 병이 내 옷 방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락이 되어 지고 있었다.
덜어내어 후련하다는 안도감과 이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부자가 되었다는 여유로 오늘은 커피 한잔 내려서 마당을 걸어 보기로 하였다. 잔디 사이로 잡초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얼른 호미를 찾으러 창고 문을 열었다. 버렸던 옷 꾸러미가 고스란히 구석에 숨겨 놓은 듯 숨어 있었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수집광이 한 사람 있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 아들이 입던 옷, 쓰던 장난감, 읽던 동화책들을 어느 시기가 지나면 재활용쓰레기통에 넣었던 것이 긴 세월이 지나면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창고에서 나온다. 쌓아 두고 버리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퇴근하기만 기다리며 그것들을 뒤적뒤적 헤쳐 보았다. 그러고는 나는 어느새 자리를 잡고 앉아 추억을 뒤집어 내고 있었다. 배냇저고리였다. 이렇게 손바닥만 할 때가 있었구나....... 공룡 이름을 다 기억 할만치 이것들을 좋아했었지.......아이의 다 쓴 도화지에서 참 즐겨 그렸던 로봇을 보았다.......
창고 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꼬박 반나절을 보내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