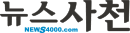사천 곤양 비봉내마을에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문 열어

배움의 주제는 ‘농어촌’. 농업이나 어업 기술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배움의 대상인 셈이다. ‘농촌을 배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하는 생각으로 잠시 귀를 기울였다.
강의명은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20대에서 50대까지, 교육생들의 연령은 달라 보였지만 표정은 하나 같이 진지했다. 이들은 6~7명 씩 모둠을 지어 농촌 미래에 관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10년 후에 농촌에 늘어나는 것은?... 빈집, 친환경농업단지, 공장, 다문화가정, 휴경지...”
“농촌 살기 힘들다, 왜?... 초고령화, 소득이 낮아서, 교육․문화․의료시설 부족,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체험지도사, 조금은 낯선 용어다. 이날 교육진행을 맡은 (주)지역활성화센터 전인철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농어촌체험지도사가 특별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이 교육을 통해 농어촌 마을이 지닌 숨겨진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눈뜨게 된다고 한다.
사실 이 농어촌체험지도사는 농수산식품부가 인증한다. 전국에 1200여 개의 각종 체험마을 또는 테마마을이 지정돼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천차만별이다. 어느 마을은 짜임새가 있어 찾는 사람이 많은 반면 어떤 마을은 이름만 그럴싸할 뿐 속이 텅 비었다.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지사.
농수산식품부에서는 그 이유를 따져 봤다. ‘대한민국 농어촌이야 다 엇비슷한데 무슨 이유로 체험마을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걸까’ 하는 의심을 해 본 것이다. 그 결과 제일 중요한 변수가 ‘사람’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마을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비봉내마을은 농수산식품부가 지정한 교육장소요, 교육을 담당하는 (주)지역활성화센터는 몇 안 되는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기관인 셈이다.
여기에 농어촌체험지도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경남농업기술원이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1인당 180만원이던 수강료가 43만원으로 내려가 수강생들의 부담을 덜어 줬다.
이렇게 출발한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은 경남 20개 기초단체에서 모인 수강생 40명으로 지난 24일 문을 열었다. 이 교육은 2박3일씩 4회에 걸쳐 103시간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농어촌체험을 위한 기획과 운영 전반이며, 주로 토론과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따라서 경남농업기술원도 이 농어촌체험지도사를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배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농어촌체험지도사를 길러낼 예정이다.
현재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기관은 전국에 4곳이며, 경남의 이번 교육은 전국에서 세 번째다.
그렇다면 “지정만 했을 뿐 후속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각종 체험마을이 체험지도사 양성으로 새로이 거듭날 것인가.
이날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에 임하는 수강생들의 열정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듯 보였다. 수강생 저마다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아 보이는데도 “배울 것이 많다”고 한 목소리였다.

농어촌체험지도사들의 안내에 따라 도시민들이 농어촌에서 이색 체험과 관광을 즐기는 모습. 상상 그 이상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