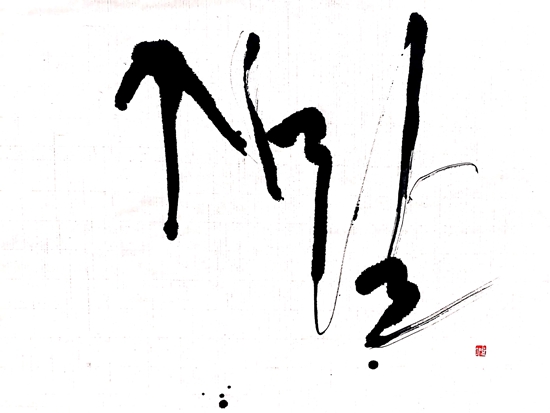
간혹 숨어들었던 그곳에서는 블루스 음악이 가득했다. 야간 자율학습에 시달렸고, 예수쟁이의 보이지 않는 신앙 양심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가 않았다. 열여덟 번째 맞이하는 생일날 친구 손에 이끌려 간 그곳은, 낮에는 돈가스가 나오는 레스토랑이었고 밤이 되면 칵테일을 팔았던 그런 지하 공간이었다. 큰 뮤직비디오 스크린이 있었고 항상 블루스 음악이 흘렀다. 사춘기 여고생에게 숨구멍 같은 위안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서 스크루드라이버, 핑크레이디를 알았고 어른 흉내를 내던 비밀스러운 곳이 되었다. 지금도 블루스 음악이 흐르는 공간을 가면 나는 젊어지고 자유로워진다.
술을 숨어서 배운 탓일까. 지금도 남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은 여전히 나에게는 이상향 같은 감정을 즐길 때만 허락되는 유일한 사치품이 되었다. 술자리에선 술보다는 안주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친구의 사연보다는 흐르는 음악에 더 귀를 쫑긋 세우곤 한다.
어두운 조명 긴 탁자 위는 거창한 안주가 없어도 맛있는 이야기로 제법 여유롭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필, 그러면서 규칙적인 리듬이 있는 그루브라는 가게 이름이 참 좋았다. 내가 사는 게 그루브라 생각했다. 그 곳에 머리 희끗한 남자는 가끔 내가 좋아하는 올리브 안주를 내놓는다. 함께 간 젊은 경제학자도 블루스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저 소싯적 향수와 몸의 느낌으로 좋아하는 나와는 달리 영국에서의 오랜 유학 생활로 다져진 낯설지 않은 얘깃거리가 있어 뜻하지 않게 디제이를 옆에 두는 호사를 누린다.
한 무리의 젊은 사내들이 들어와 밀폐된 공간은 금세 소란스러워졌다. 젊음이겠거니 여겼다. 목선이 길게 빠진 맥주잔을 비우며 자신의 수위만큼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고민 속에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었다. 사람은 살면서 평생 해야 할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했다. 착하기만 한 마흔에 들어선 여자는 사춘기 때 지랄을 다했다 했다.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는 아직 한 적이 없었으니 앞으로 하게 될 거라며 그 지랄을 기대한다. 모범생으로 큰 역경 없이 지내다 지금 자리에서 고민이 많은 사내는 지금 그 지랄을 하고 싶은가 보다. 모두가 이제까지 지랄의 총량을 달고 있을 때 나는 그저 옆에서 피식 웃고만 있을 뿐이다. 웃음만 나왔다. 눈빛들이 나에게로 올 때.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랄 총량의 법칙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전 평생 동안 내내 지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