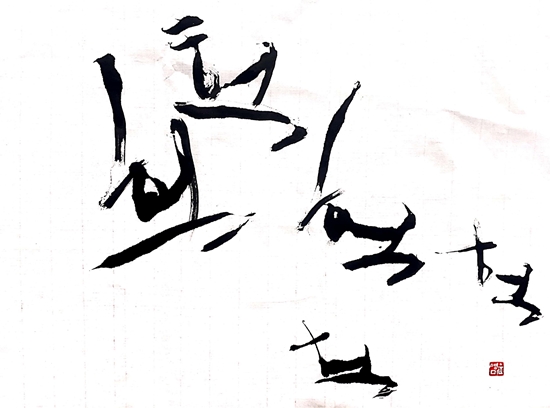
“네 시에 만날까요?”
시간 약속이 정해지는 순간 모든 기억회로는 세시 오십분으로 맞추어진다. 십분 전 나는 꼭 그 약속장소로 가야만 했다. 친구 중에는 약속 시간을 맞추어 나오는 친구가 있고, 항상 습관적으로 약속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친구가 있었다. 혈기가 하늘을 치솟고 성질머리 왕성했을 때는 정확하게 네 시에서 일분이 지나는 동시에 나는 가차 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 나오곤 했다. 그래서 한때 내 별명이 십분 전이었던 적이 있었다. 약속시간이 출발시간인 친구도 있어 시간의 개념이 나와 맞지 않는다며 몹시도 화를 내기도 했다.
“넌 강도야. 남의 시간을 도적질 해 버렸잖아! 나는 귀한 시간을 이곳에 서서 멍하니 다 날려 버렸어.”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은 다소 나와의 시간 약속은 잘 지켜주는 편이다. 다른 건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로우면서도, 유독 시간이나 정해진 일에 대한 약속은 병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이 나에게는 참 어려운 숙제였다. 지켜 주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실수 할까 몹시도 두려웠다.
나와 같은 습관의 사람을 간혹 만나게 된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나는 십분 전에 도착해 느긋하게 음악도 듣고 옷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싶어 그곳엘 도착하였더니, 그도 벌써 그곳엘 도착해 있었다. 서로 웃어 버렸다. 우린 이것이 무슨 뜻이지를 알아챘다. 우리는 십분 전에 그곳을 홀연히 벗어날 수 있었다.
어른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과 약속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의 탁상용 다이어리는 빽빽하게 한 달의 일정이 적혀 있었고, 때로는 겹치기도 하고 연이어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정이라는 것으로 나는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추질 못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미안한 감정이 항상 약속의 덤처럼 불어났다. 십분 전이라는 별명이 무색해져 버렸다.
그 서슬 퍼런 칼날 같았던 내가 변해 갔다. 약속시간 전에 도착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버렸다. 결국 약속시간은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기다린다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방이 긴장이 되어 그의 시간을 내가 뺏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버렸다. 이젠 내가 기다린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나이인지 모른다.
십분 전, 나는 그곳엘 도착해 옷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머리를 쓸어내리고는 시계바늘이 약속시간을 가리키기가 무섭게 방금 막 도착한 듯이 숨을 심하게 헐떡거리며 들어선다. 헉. 헉. 헉. 헉.

